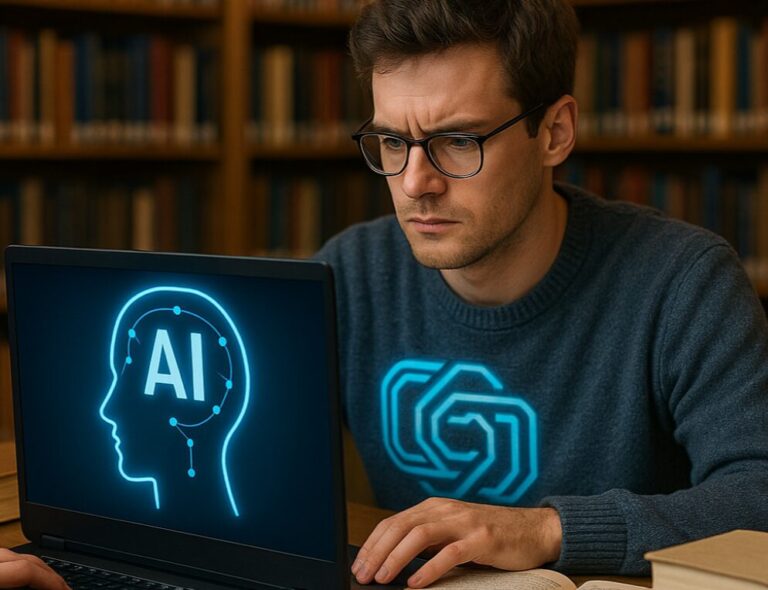센테너리 대학, ‘행복학 박사과정’ 개설… 정신건강 위기 시대에 던지는 교육의 근본 질문
“지금 이 시대, 가장 절실한 학문은 행복입니다”
2025년 7월, 미국 뉴저지의 소규모 대학이 전 세계 교육계의 이목을 끄는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했다. 센테너리 대학교(Centenary University)가 ‘행복학 박사(Ph.D. in Happiness Studies)’ 과정을 공식 개설한 것이다. 완전 온라인 기반의 4년 과정으로 설계된 이 박사학위는 단순한 긍정심리학이 아닌, 뇌과학과 철학, 교육학, 문학, 종교, 리더십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웰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최초의 고등학문 프로젝트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울, 불안, 고립감, 무기력의 파도가 덮쳐오는 시대입니다. 행복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주인공, 하버드대에서 ‘긍정심리학’ 강의로 인기를 끌었던 탈 벤 샤하르(Tal Ben-Shahar)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
팬데믹 이후,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사람들
왜 지금, 그리고 왜 ‘행복’인가?
센테너리 대학이 강조하는 배경은 분명하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일로에 있고,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고립감과 방향감각 상실은 치명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Z세대의 1/3 이상이 “매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대학생들의 우울·불안 호소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한국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자살률이 급증했고, ‘무기력’은 대학 강의실과 도서관, 동아리방을 떠도는 공통 감정어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센테너리 대학교 데일 콜드웰 총장의 말이다.
센테너리의 행복학 박사과정은 총 66학점으로 구성되며, 교육(Education),연구(Research),리더십(Leadership), 인간번영(Human Flourishing)4개의 교육 영역으로 과정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도가사상가 노자, 시각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지도자 넬슨 만델라 등 다양한 인물과 사상을 탐구하며, 이들이 실천한 행복의 정의와 실현 방식을 학문적으로 분석한다.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2년 차부터 자신의 전공 분야에 SEL, 긍정심리학, 인간 번영 개념을 접목한 현장연구 기반의 논문(Dissertation)을 수행해야 한다.
‘행복학’은 실용학문이다
탈 벤 샤하르 교수는 “행복학 박사과정은 단순히 개인적 명상이나 심리치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시스템, 조직문화, 교육정책, 정부행정 등 모든 삶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응용학문입니다”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 과정은 졸업 후 조직의 행복책임자(Chief Wellbeing Officer), 교육기관 및 정부의 정책자문관,비영리단체 및 커뮤니티 기반 리더십 개발 컨설턴트, 정신건강 및 웰니스 관련 분야의 실천가와같은 역할을 수행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웰니스 기업가 로넬 요스트(Ronel Jooste)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 주위에 모든 삶의 측면에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그녀는 박사과정을 마친 후 ‘행복 사파리(Happiness Safaris)’라는 이색 웰니스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전통 문화와 뇌과학, 리더십 코칭을 결합한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요스트는 말한다. “행복은 과학이고 예술이에요. 내가 그 과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행복을 ‘학문화’한다는 발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을 박사학위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웰니스 산업이 자본주의적 소비 트렌드와 결합될 경우, 진정한 인간성 회복보다는 ‘힐링 산업’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센테너리 측은 오히려 그 지점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본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신비화하거나 감정에 맡기지 않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그것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행복학’은 새로운 대학교육의 실험이다
사실 센테너리의 행복학 박사과정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세계 최초의 행복학 석사(M.A. in Happiness Studies) 과정을 운영해왔다. 불과 3년 만에 13개국, 8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박사과정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장된 것이다. 박사과정은 연간 25명을 선발하며, 최종적으로 100명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교육자, 상담가, 공공행정 전문가 등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경쟁지향 문화를 갖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학생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지표, 사회적 관계의 질에서는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해왔다. 입시가 끝나면 삶이 끝난 듯한 허무, 경쟁이 끝나도 회복되지 않는 자존감의 손상, 관계보다 성과가 우선시되는 조직문화 속에서, 대학은 여전히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대학에 던져야 할 질문은 어쩌면 다음과 같을지도 모른다. 대학은 진짜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서적 탄력성과 공동체적 소속감을 어떻게 학문화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행복학’은 대안적 학문이 될 수 있을까?
센테너리 대학교의 실험은 단순한 교과과정 개편이 아니다. 그것은 ‘학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단순히 수치와 기술, 논리와 구조만을 가르치는 교육은 이제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세상은 이제 ‘배운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행복은 더 이상 철학의 영역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자, 연구의 대상이며,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센테너리 대학의 선택은 질문한다.
“지금 당신의 대학은, 학생에게 살아갈 이유를 묻고 있는가?”
#행복학박사 #CentenaryUniversity #TalBenShahar #PositivePsychology #HumanFlourishing #정신건강위기 #고등교육혁신 #SEL #교육의목적 #행복은과학이다 #스포트라이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