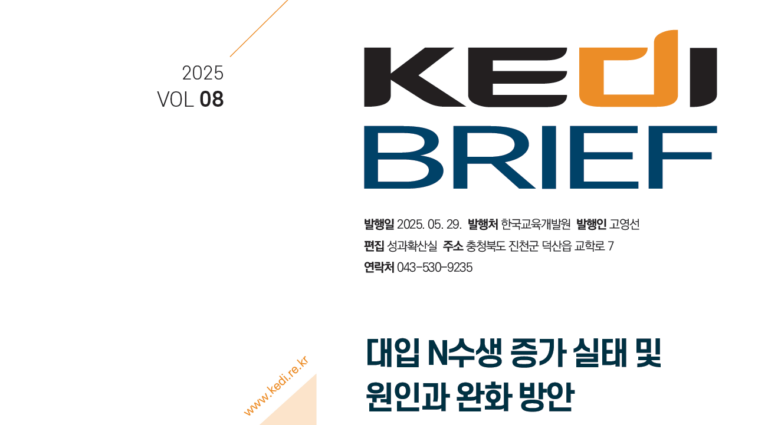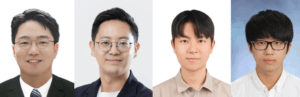자가면역질환과 바이러스 감염 모두에서 작동… 감염병·면역 치료 전략 새 장 열어
KAIST 김유식 교수(생명화학공학과)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차승희 교수 공동 연구팀이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면역질환의 공통된 면역 조절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유래 이중가닥 RNA(mt-dsRNA)가 면역반응을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단백질 ‘SLIRP’를 발견하고, 이를 ‘면역 스위치’로 규명했다. 이 연구는 향후 감염병 대응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정밀성과 효과성을 높일 핵심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바이러스 RN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mt-dsRNA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SLIRP 단백질은 이러한 mt-dsRNA를 세포질 내로 안정적으로 유출되도록 하여, 면역센서(MDA5, PKR 등)를 자극하고 강력한 인터페론 반응을 유도한다. 이는 세포 내에서 면역반응을 증폭시키는 ‘양성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SLIRP가 이 피드백 루프의 중심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병과 자가면역질환, 하나의 단백질로 양방향 조절 가능
연구 결과 SLIRP는 감염 상황에서는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고, 반대로 자가면역질환에서는 과잉 면역반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OC43), 뇌심근염 바이러스(EMCV) 감염 세포에서 SLIRP를 억제하자 바이러스 복제가 증가하고 면역반응은 감소했으며, 반대로 자가면역질환인 쉐그렌 증후군 환자 조직에서는 SLIRP가 과도하게 발현되어 있었고, 억제 시에는 비정상 면역반응이 완화되었다.
SLIRP는 단일 인자로 양극단의 면역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양방향 조절 스위치’라는 점에서 감염병과 면역질환 모두에 활용 가능한 치료 전략의 표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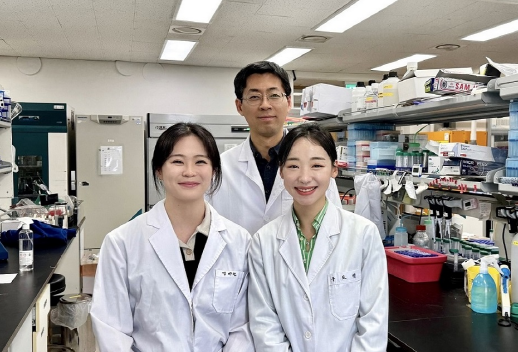
이번 연구는 자가면역질환 환자(쉐그렌 증후군, 전신홍반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조직에서 SLIRP의 과발현을 확인하고, 실험적 억제에 따른 인터페론 감소 효과를 통해 치료 가능성도 입증했다. 연구를 주도한 김유식 교수는 “SLIRP는 감염과 자가면역 상태 모두에서 면역반응을 증폭 또는 완화하는 ‘정밀 조절 인자’로 작용하며, 면역 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LIRP는 향후 질환 예후 예측이나 치료 반응을 판별하는 바이오마커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면역억제제의 부작용 문제를 보완하는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학술지 『Cell Reports』 게재… KAIST 박사과정생 구도영 제1저자 참여
이번 연구결과는 2025년 4월 19일, 국제 저명 학술지 『Cell Report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으며, 논문명은 「SLIRP amplifies antiviral signaling via positive feedback regulation and contributes to autoimmune diseases」이다.
제1저자는 KAIST 박사과정 구도영, 제2저자는 석사과정 양예원, 교신저자는 김유식 교수와 차승희 교수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과 미국 NIH 연구과제(R01)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논문 링크: https://doi.org/10.1016/j.celrep.2025.115588
#KAIST #SLIRP단백질 #면역조절스위치 #자가면역질환치료 #감염병면역반응 #정밀면역치료 #바이러스면역 #mtRNA #CellReports #김유식교수연구